“최근 전 세계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공유경제, 특히 차량공유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자율주행기능을 통한 차량공유의 극대화’라는 미래 경제·사회의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투자와 도로 인프라 및 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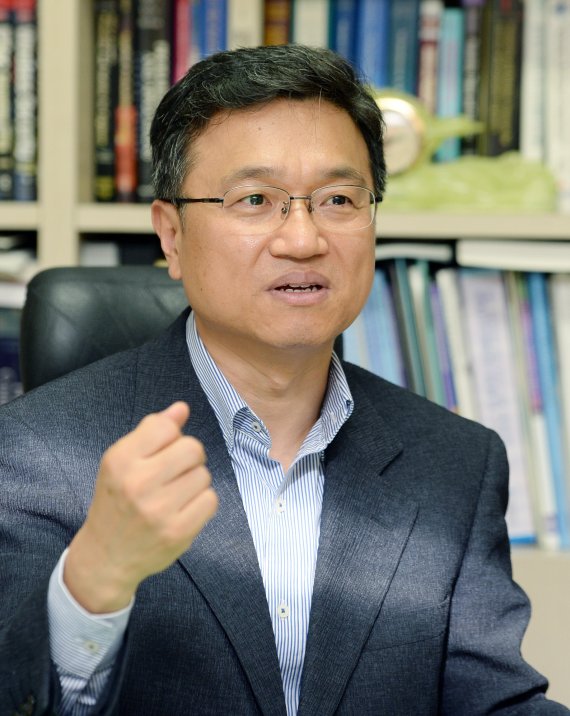
▲서울대학교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자율주행의 뇌=SW플랫폼 주도권 확보경쟁
서울대학교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사진)는 지난 24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에서 진행된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5~2030년 사이에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질서 재편기를 맞게될 것”이라며 “구글,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의 전자화’, 즉 자동차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할 방안을 본격 연구해왔다. 그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주제로 박사과정 연구를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을 직면했다”며 “당시 가까운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 전자제어장치(ECU) 간의 통신 네트워크로 분야를 확대해 연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2000년 대 중반 ‘스마트 카’ 개념이 급부상하면서 도로 위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인프라 간의 통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서 교수도 2009년 서울대에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를 세워 ‘무인 태양광 자동차’ 등을 개발했다.
그는 “2013년 10월 열린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학부 학생들과 함께 만든 ‘베이비 인 카’가 최우수상을 받은 직후, 도심형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스누버’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무인 자율주행택시 표방한 '스누버' 개발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가 약 2년여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해 11월 첫 공개한 ‘스누버(SN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앱으로 호출 및 운영되는 ‘무인 자율주행택시’인 셈이다.
서 교수는 “서울대 캠퍼스는 약 50만 평이 넘는데, 15층 높이의 공학관은 특히 외진 곳에 있어 학교 정문까지 꽤 거리가 멀다”며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캠퍼스 내 순환버스도 끊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은 시각에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인 자율주행택시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스누버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의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됐다. 서 교수는 “스누버는 하드웨어 부품 개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기존의 차를 100% 활용하면서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율주행차는 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주체가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호출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차량 운행의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이 핵심인 자동차 서비스인 것이다.
스누버는 미리 입력된 3차원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주행이 이뤄진다. 가격대비 상대적으로 위치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대신에, 자동차 곳곳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서 교수는 “사람들이 기존에 방문했던 장소의 인근 건물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며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스누버도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눈길에서 차선 인식이 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IT 및 학계와 전략적 제휴 시급
스누버가 이처럼 ’개방형 플랫폼‘, 즉 어느 자동차에서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은 전 세계 자율주행기술 동향과 맞물려 있다. 구글은 지난달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에 나섰으며, 바이두는 BMW3 시리즈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또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최근 ’테슬라 모델S’ 이용자가 SW를 업데이트하면 도로 상황에 맞춰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 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카네기멜론대 로봇공학센터의 연구진들을 대거 영입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즉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급변하는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나홀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애플과 제널럴모터스(GM) 등이 각각 중국의 디디추싱과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에 투자한 것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와 관련 인프라의 질서를 재편할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도 산·학·연과 관련 업체 간 활발한 기술제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SW생태계 확보로 정책우선순위 바꿔야"
특히 서 교수는 우리 정부의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향후 7년 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국책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대부분 자율주행 기반 부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양산용 부품 개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핵심 두뇌 역할을 할 AI와 SW 부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율주행차 공유시대’의 변화상을 미리 읽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전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구글과 우버, 포드 등 각 분야별 대표주자들이 최근 ‘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자율주행 연대(The Self-Driving Coalition for Safer Streets)’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협의체는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 대중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의 안전문제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 교수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주최하는 '제7회 모바일포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Game Changer,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서울대 서승우 교수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대학교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약력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석사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지정 지능형자동차 정보기술(IT) 연구센터장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인텔리전트 자동차 심포지엄 공동의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 CARS 방문 교수 △서울대 소재 만도 이노베이션랩 운영책임교수 △서울대 소재 LG전자 스마트카센터 운영책임교수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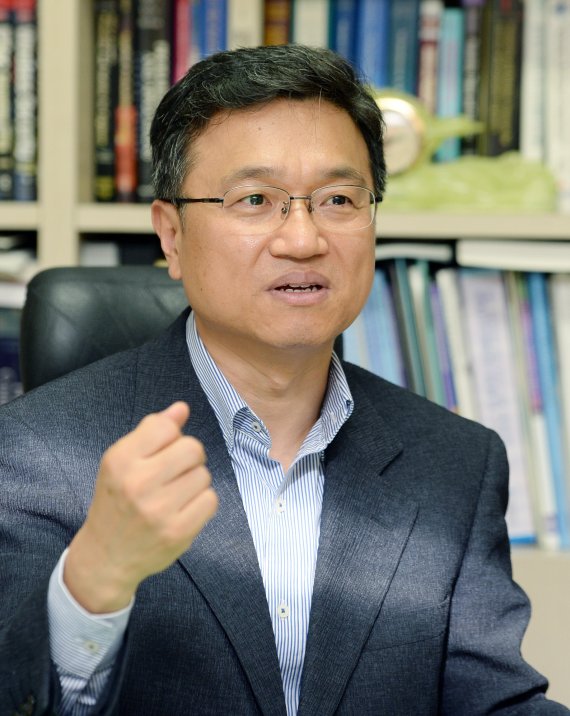
서울대학교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사진)는 지난 24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에서 진행된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5~2030년 사이에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질서 재편기를 맞게될 것”이라며 “구글,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의 전자화’, 즉 자동차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할 방안을 본격 연구해왔다. 그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주제로 박사과정 연구를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을 직면했다”며 “당시 가까운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 전자제어장치(ECU) 간의 통신 네트워크로 분야를 확대해 연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2000년 대 중반 ‘스마트 카’ 개념이 급부상하면서 도로 위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인프라 간의 통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서 교수도 2009년 서울대에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를 세워 ‘무인 태양광 자동차’ 등을 개발했다.
그는 “2013년 10월 열린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학부 학생들과 함께 만든 ‘베이비 인 카’가 최우수상을 받은 직후, 도심형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스누버’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무인 자율주행택시 표방한 '스누버' 개발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가 약 2년여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해 11월 첫 공개한 ‘스누버(SN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앱으로 호출 및 운영되는 ‘무인 자율주행택시’인 셈이다.
서 교수는 “서울대 캠퍼스는 약 50만 평이 넘는데, 15층 높이의 공학관은 특히 외진 곳에 있어 학교 정문까지 꽤 거리가 멀다”며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캠퍼스 내 순환버스도 끊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은 시각에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인 자율주행택시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스누버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의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됐다. 서 교수는 “스누버는 하드웨어 부품 개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기존의 차를 100% 활용하면서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율주행차는 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주체가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호출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차량 운행의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이 핵심인 자동차 서비스인 것이다.
스누버는 미리 입력된 3차원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주행이 이뤄진다. 가격대비 상대적으로 위치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대신에, 자동차 곳곳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서 교수는 “사람들이 기존에 방문했던 장소의 인근 건물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며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스누버도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눈길에서 차선 인식이 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IT 및 학계와 전략적 제휴 시급
스누버가 이처럼 ’개방형 플랫폼‘, 즉 어느 자동차에서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은 전 세계 자율주행기술 동향과 맞물려 있다. 구글은 지난달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에 나섰으며, 바이두는 BMW3 시리즈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또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최근 ’테슬라 모델S’ 이용자가 SW를 업데이트하면 도로 상황에 맞춰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 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카네기멜론대 로봇공학센터의 연구진들을 대거 영입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즉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급변하는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나홀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애플과 제널럴모터스(GM) 등이 각각 중국의 디디추싱과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에 투자한 것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와 관련 인프라의 질서를 재편할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도 산·학·연과 관련 업체 간 활발한 기술제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SW생태계 확보로 정책우선순위 바꿔야"
특히 서 교수는 우리 정부의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향후 7년 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국책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대부분 자율주행 기반 부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양산용 부품 개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핵심 두뇌 역할을 할 AI와 SW 부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율주행차 공유시대’의 변화상을 미리 읽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전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구글과 우버, 포드 등 각 분야별 대표주자들이 최근 ‘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자율주행 연대(The Self-Driving Coalition for Safer Streets)’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협의체는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 대중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의 안전문제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 교수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주최하는 '제7회 모바일포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Game Changer,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약력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석사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지정 지능형자동차 정보기술(IT) 연구센터장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인텔리전트 자동차 심포지엄 공동의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 CARS 방문 교수 △서울대 소재 만도 이노베이션랩 운영책임교수 △서울대 소재 LG전자 스마트카센터 운영책임교수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