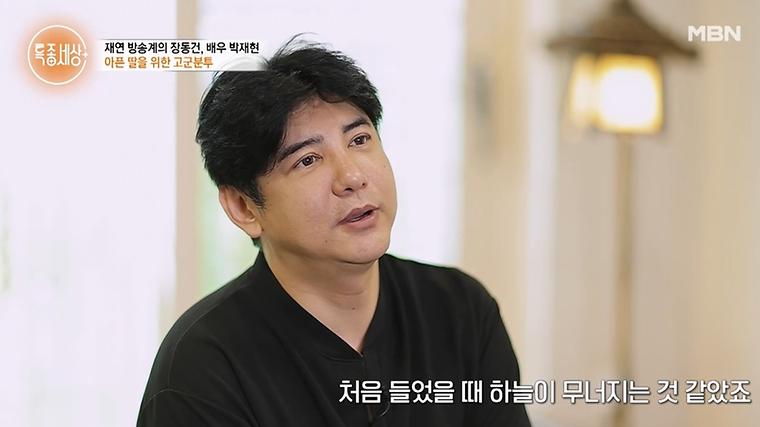![“스테이블 코인, 결제 수단 넘는 국가 전략”…韓, 싱가포르·홍콩과 다른 길 간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5]](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2/202506121151259883_l.jpg)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을 활용해 자산이 이동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12일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한 앤드류 크로포드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부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고유한 접근법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크로포드 부사장 외에도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시각을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주권의 문제
김 대표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과 마켓스트럭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고, 홍콩은 8월부터 본격 규제를 시행한다”며 “한국도 전략적 포지셔닝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실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혁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화 주권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충격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통화의 금융영역을 확장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기존 금융기관이나 빅테크 이머니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우리는 이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한 달 내 실사용 가능한 상태로 구현했다”며 “하지만 한국 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막혀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국내에서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전환하려 해도, 한국 측 발행 주체가 없으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은행+자본시장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해답
크로포드 부사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단순 결제 기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통해 훨씬 더 다양한 경제적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은행 기반 모델과 자본시장 기반 모델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대상 은행이 준비금 관리와 육성 권한을 갖고, 민간 주체가 발행 및 활용을 담당하는 이중구조는 혁신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있어야만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서도 신뢰성과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팀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발행 주체와 적립구조에 대한 복수의 보완 장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국도 신뢰 기반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여자들은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단순한 제도화나 글로벌 추종이 아니라, 결제 효율성과 금융주권, 신뢰 구축과 기술 혁신의 균형 위에서 독자적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크로포드 부사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닌, 디지털 가치 이동의 기반 인프라로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룹으로 가치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규제와 구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본질적”이라고 덧붙였다.
류 팀장도 “투자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발행자 요건, 실시간 보고, 운영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이 신뢰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활동 중단' 지나, 오랜만에 셀카…근심 어린 얼굴
- 2"수지 결혼설, 상대는 뷰티업체 대표" 글 확산에…소속사 "걸리면 혼난다"
- 3황보 "속옷까지 다 벗으라더라"…이스라엘 국경서 몸수색당했다
- 4김남주 "혼자 있고 싶어 호텔行…남편 김승우가 112 신고"
- 5[단독]롯데·HD현대 빅딜 윤곽...설비 넘기고 지분 5대 5로 조정
- 6김지민 "♥김준호 코골이 때문에 신혼인데 각방 쓸 때도 있어"
- 7"태동 느껴보자"더니 가슴 움켜쥔 시아버지…남편은 "유혹했냐" 막말
- 8"24시간 붙어있어"…176㎝ 서하얀, 남편 임창정보다 확연한 큰 키 눈길
- 9성생활 못 즐기는 여성…'이 운동'으로 개선 가능? [헬스톡]
- 10김지혜 "반포동 90평대 아파트 혼자 마련…생활비도 내 돈"





![정채연, 홀터넥 비키니 입고 과감한 등 노출…완벽 미모 [N샷]](https://image.fnnews.com/resource/crop_image/2025/08/27/thumb/202508271424489533_17562808543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