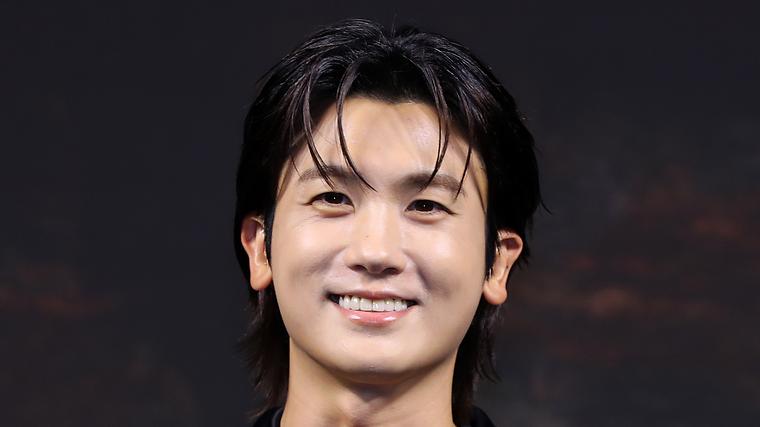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져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서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나중에 동국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서훈취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밝혀졌으므로 망인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피고의 서훈 취소 심의에 반영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나중에 동국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서훈취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밝혀졌으므로 망인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피고의 서훈 취소 심의에 반영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사유리 "남편 없이 홀로 출산 외로웠다…비혼모 출산 돕고파"
- 2"검은점 생긴 바나나 절대 먹지마세요" 전문가 경고, 이유가 [헬스톡]
- 3'아이폰17'에 무슨 일이…‘영포티', '아재폰'에 추가된 타이틀 '李대통령'
- 4[뉴스1 ★]금새록, 복싱 몸매+블랙 시스루…BIFF레드카펫 올킬!
- 5워커힐아파트, 50년만에 재건축 시동…1020가구 단독주택형 아파트 추진
- 6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美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
- 7간병으로 5㎏ 빠진 남편…암 완치 아내는 불륜, '이혼 기원' 부적도 [헤어질 결심]
- 8'20살 혼전 임신' 홍영기 "남편은 고등학생이었다"
- 9[뉴스1 ★]블랙핑크 리사, 부산영화제 '깜짝 손님'…독보적인 아우라
- 10李대통령, 전남 무안·함평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