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부지점장 통해 대출받아
확인 안한 우리銀 손배 인정됐으나
청구권 시효소멸 배상책임 벗어나
남편만 고스란히 배상 떠안을 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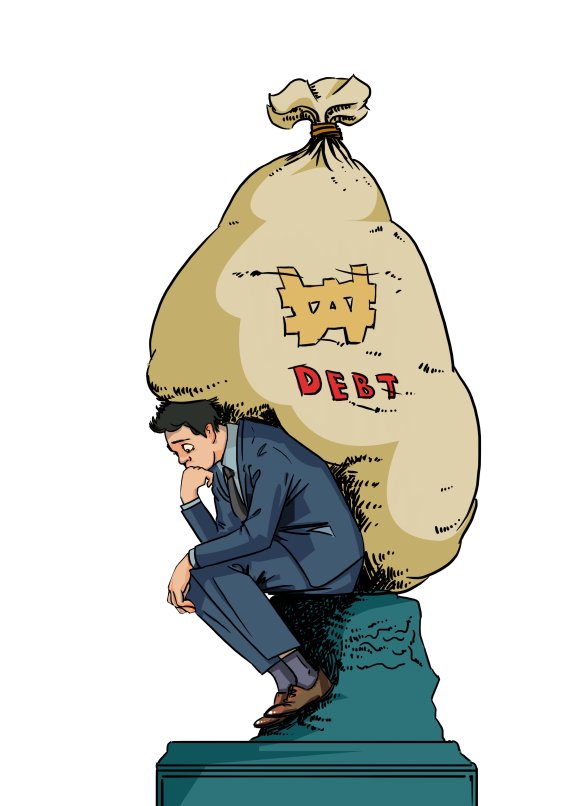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
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
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