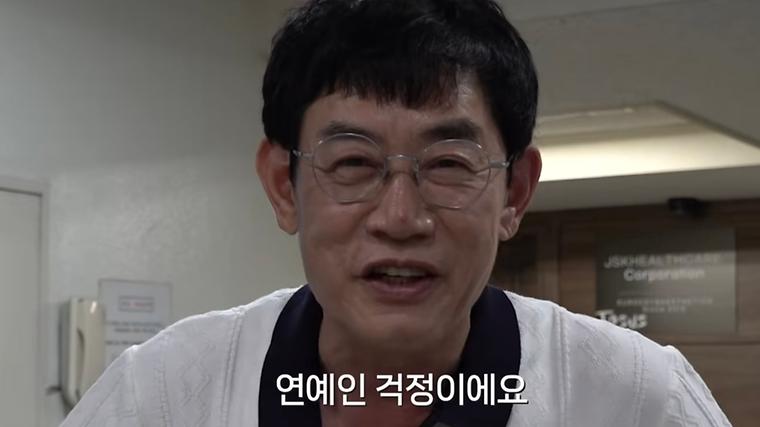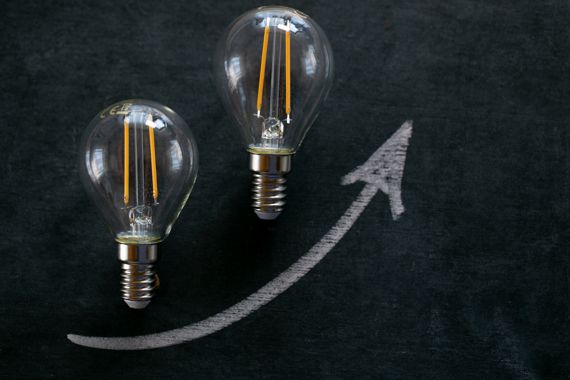
1890년대 장거리 송전의 한계로 직류 패배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디슨은 1878년 에디슨 전등회사를 설립하고 1882년 3대의 직류발전기로 3000여개의 백열전구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최초의 전력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에디슨사는 전력공급 방식을 110볼트 직류를 사용했다.
하지만 110볼트의 낮은 전압의 직류는 먼 거리까지 전력을 보내는 데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전압을 올려서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압을 다시 내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에디슨은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때 등장한 인물이 세르비아 출신인 니콜라 테슬라였다. 에디슨사의 파리지사에 취직한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이후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에디슨의 직류에 대한 고집으로 인해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교류를 발전시켜 나갔다. 교류는 소비지역에 인접해서 변압을 거치면 되므로 전력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쟁과정에서 에디슨은 교류 전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여론전까지 펼쳤다. 고전압 교류 전류가 감전될 위험이 크다는 경고 팸플릿을 만들어 뿌렸으며,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발전기를 에디슨이 직접 사서 교도소에 사형 집행 도구로 쓰라고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전에도 교류는 승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893년 5월에 시카고 만국박람회장을 밝힐 25만개의 전구를 감당할 기술로 교규전기가 선택하면서 첫 승리를 거뒀고, 1896년 나이아갈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42km 떨어진 도시 버팔로로 수송하는 경쟁에서도 승리했다. 이후 교류가 전세계 송전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에디슨과 테슬라간의 경쟁은 전류전쟁(War of current)라고 불리고 있다.
기술 극복 '직류', 송전 표준될 수 있을까
직류는 (+)와 (-)극을 가진 전기로 시간이 지나도 전류와 전압이 일정하다. 반면 교류는 주기적으로 (+)와 (-)극이 바뀐다. 시간에 따라 전류와 전압도 달라진다. 우리가 현재 쓰는 전기도 1초에 60번 방향이 바뀌는 60㎐ 교류다.
전류전쟁 이후 교류가 130년 넘게 송전 표준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력의 발달로 직류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 특히 초고압 직류송전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이 직류의 가치가 달라진 배경이다.
HVDC는 고압의 교류를 직류 전기로 바꿔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류와 직류를 바꿔주는 전력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다. 한전은 제주도와 육지를 HVDC 방식으로 연결했고,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에도 HVDC 건설을 추진중이다.
HVDC로 송전선로를 구성하면 송전탑이 작아진다. 한울-신가평 HVDC 사업의 경우 기존 AC 765kV 철탑 대비 25%정도 높이를 줄이고 철탑 선하지 면적 또한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C 자계는 지구자계와 동일하여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없다.
이론적으로도 직류가 교류보다 경제적이다. 송전거리 확보에 애를 먹었던 직류는 교류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효율적이다. 100의 전력을 보낸다고 할 때 교류는 전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대 140과 최소 60을 왔다 갔다 한다. 직류는 100 그대로 보내면 된다. 이처럼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최댓값에 비해 크기가 약 70%이기 때문에 절연도 쉽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손쉽게 전력망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어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사랑이 죄인가요"…직장상사와 불륜 저지른 女의 억울함 토로
- 2李대통령, 영남 55% 전지역 '과반'…국힘 4년8개월 만에 10%대 추락
- 3채정안 "이지혜 때문에 유흥주점 갔다…무대 장악하더라"
- 4"尹,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김계리, 영치금 계좌번호 공개
- 5"아파트 다섯채 팔아 이사왔어요" 눈물...은마와 겨뤘는데 [부동산 아토즈]
- 6"강선우 폭로 쏟아져…대리운전 갑질에 10분마다 욕" 주진우 연일 비난
- 7직원들에게 소맥 타준 李대통령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 많이 해야"
- 8"과일 깎으려 했다" 며느리 흉기로 7번 찌른 80대 시아버지 징역 3년
- 9"BTS도, 회장님도 줄을 서셨죠" 전국 최고가 노리는 집 나왔다
- 10'260명 사망' 에어인디아 추락 원인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