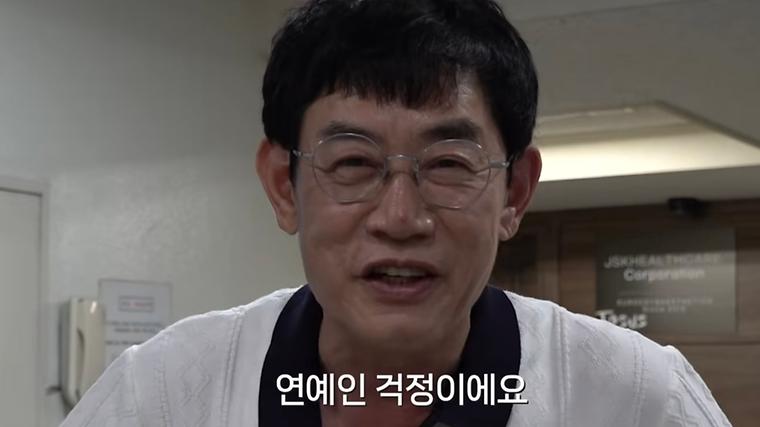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문재인측 인사들에게 화살
이언주는 당적 변경만 6회
![[손성진의 직평직설] '철판' 추미애와 '철새' 이언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1/31/202401311830200360_s.jpg)
한동안 '자숙'하는 듯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슬슬 발동을 건다. '난, 죽지 않았다'는 듯 존재감을 드러낸다. 자숙한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가 추미애 자신임을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는 추측에서 쓴 말이다. 그러나 전혀 자숙한 것이 아니었다. 또 선거판에 뛰어들겠다는 깊은 심산의 표출로 느껴진다.
추미애가 누구던가. 당시 윤 총장의 검찰을 쥐고 흔들려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대선 주자로 만든 사람 아닌가. "명을 거역했다"는 여왕 같은 발언이나 초법적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일이 다 쓰기도 힘든 돌출 과격언행의 기억이 또렷하다.
추미애를 장관으로 낙점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도 주문도 하지 않은 일을 멋대로 벌이며 오버하는 싸움닭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미애가 느닷없이 윤 총장 임명 책임을 물으며 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총장 임명부터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다. 당하는 쪽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운다면, 첫 번째가 바로 추미애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추미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윤 총장을)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임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했다. 총선 출마 의향을 비친 임종석을 물귀신처럼 걸고넘어진 것이다.
한때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고, 추미애의 장관 시절을 지켜봤던 임종석은 깊은 탄식과 헛웃음이 나올 법하다. 추미애의 낯이 정말 '철판'처럼 두껍다고 한다면, 이제 임종석도 선뜻 동의할 것이다. 추미애는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도 추켜세웠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과거를 '세탁'하겠다는 뜻일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추미애만큼 고마운 사람도 없다. 신선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마당에서 윤 대통령을 정치의 세계로 이끌고 최고권력자로 부상시켜준 공로자였다. 그 반대쪽에서 보면 추미애만큼 미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추미애만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정파에서 대권을 잡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 쪽에서 봐도 추미애의 행동은 뒤늦은 책임 전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언주 전 의원의 행보는 또 다른 정치적 천박성을 보여준다.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무소속→미래통합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힘 탈당. 대략 적은 게 이 정도다. 철새도 그냥 철새가 아니라 역마살 낀 철새처럼 틈만 나면 이당, 저당을 옮겨 다녔다. 키워준 아버지라도 성에 안 차면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기세로 덤볐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팔색조의 몸짓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귀환을 바라는 것 같다. "운동권 세력에 염증을 느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행정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냐"는 독설을 내뿜더니 당을 바꾼 다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체주의'라고 하는 등 서슬 퍼런 언사를 이어갔다.
이런 이언주의 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끌어당기고 있다. 이언주로부터 '연산군'이란 소리를 듣고도 이 대표는 친문들이 보라는 듯 합을 맞춘다. 친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당내든 당외든 비판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신조를 밥 먹듯이 뒤집어가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행태는 벌써 그 자체로 신뢰 상실이다.
옳은 말이라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변절을 목전에 뒀다면 카멜레온의 술수 그 이상이 아니다.
tonio66@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아파트 다섯채 팔아 이사왔어요" 눈물...은마와 겨뤘는데 [부동산 아토즈]
- 2"尹,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김계리, 영치금 계좌번호 공개
- 3"강선우 폭로 쏟아져…대리운전 갑질에 10분마다 욕" 주진우 연일 비난
- 4"과일 깎으려 했다" 며느리 흉기로 7번 찌른 80대 시아버지 징역 3년
- 5강남 한복판, 출근하던 여성 뒤쫓아 '로우킥' 날린 검은 복장의 남성
- 6李대통령 "韓이 日보다 美와 먼저 통상협상 가능성..시진핑 APEC 올 것"
- 7'260명 사망' 에어인디아 추락 원인 밝혀졌다
- 8"이상한 남자가 앉아있어요" 초등학교 앞 온몸 긁던 男, 알고 보니...
- 9“진짜 화냈다”…김태효, 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인정
- 10성폭행 의혹 진실 공방 … 기성용 누명쓴 것이었나, 반전 '민사 1심 판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