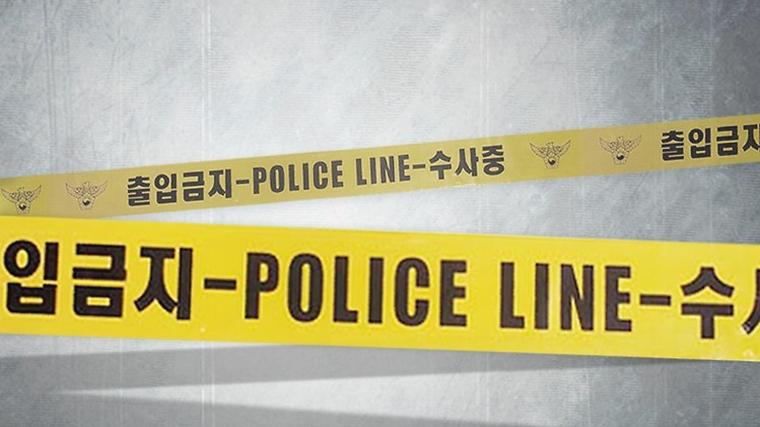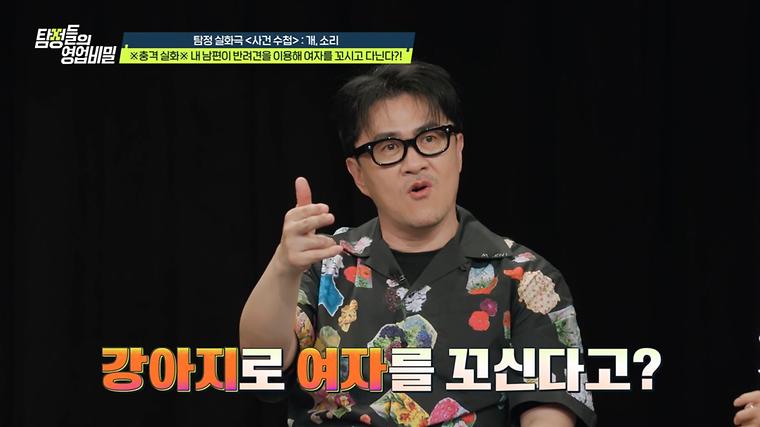![[테헤란로] 탄핵 벌써 8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09/202412091852146067_s.jpg)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안에 무려 62명의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직후 김무성·유승민을 필두로 33명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인사들은 개혁보수신당을 구성했고, 이후 31명의 의석을 갖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이때만 해도 보수진영의 드림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그런지 제대로 뭉치지 못했고 난맥상만 드러났다.
변화를 보여줄 골든타임은 흘러갔고 그사이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비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놓고 빚어진 당내 혼선에 기대감은 와해됐다.
유력 대선주자로 영입하려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중도퇴장까지 겹쳐 바른정당은 결국 창당 한 달도 안돼 고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보수진영은 혹독한 탄핵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했다. 찢긴 보수진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분열로 인해 패배를 당연시해야 했다. 이후에도 보수진영은 뭉치지 못한 채 서로를 비판했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급조됐으나 참패했다. 그 결과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등의 부작용을 비판만 할 뿐 제대로 대항도 못했다.
탄핵의 여파는 이처럼 상당했다. 쉽게 극복할 줄 알았던 당시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토로한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폐기됐다.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절박함이 있었지만 탄핵을 겪지 못한 2명의 이탈은 눈에 띄었다.
한 명은 비례대표로만 재선 국회의원이 된 인사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번 총선에서 당 국민추천제로 공천받은 초선 의원이다.
탄핵 후폭풍이 뭔지 겪어보지 못한 그들은 자신만의 '소신'이란 명분이, 공멸보다 중요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탄핵을 겪은 상당수 비윤계 인사들조차 왜 탄핵에 반대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를.
hjkim01@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알몸으로 잠든 호텔 방에 낯선 남자가…"단순 실수"
- 2태안 꽃지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사체 발견…해경 수사
- 3"스님 맞아?"…대만서 승려복 입고 길거리 키스 논란
- 4온몸 멍든 채 숨진 직장인…CCTV에 찍힌 엽기 살인
- 5원빈♥이나영 잠실 데이트 목격담…"돼지갈비 먹으러 와"
- 6[인터뷰]이준석 "정청래 '야당 없애버리겠다'는 태도, 국민 반감 부를 것…국힘과 연대, 지금은 어렵다"
- 7"어디서 유출된 건가"…19초짜리 '尹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에 확산
- 8"든든한 후원자로 묵묵히 지원"..백종원, 결국 자기 돈 100억 내놨다
- 9尹 "사랑해서 계엄까지"가 진짜라고?..특검, 계엄 동기에 '김건희' 추가
- 10영천시 육군 직할부대 대위,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