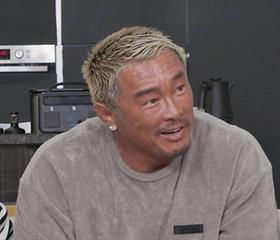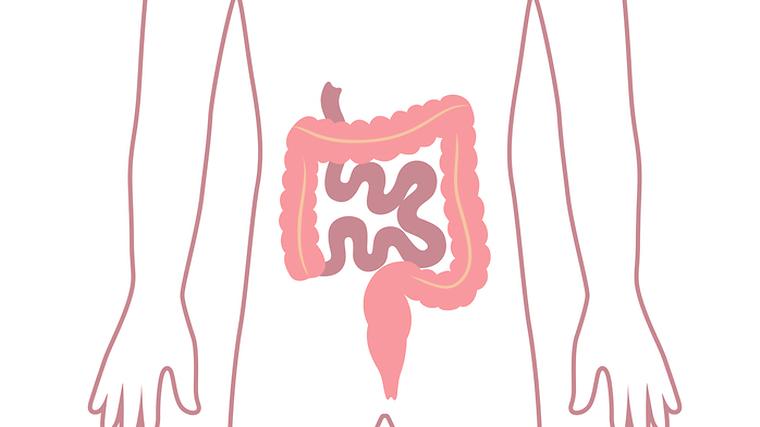![[테헤란로] 서비스로서의 과학(SaaS)](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23/202507231804587221_s.jpg)
그런데 SaaS를 과학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 SaaS에서 첫번째 S를 과학(Science)으로 바꾸면 Science as a Service(서비스로서의 과학)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 설명해 보면 과학의 서비스로서 역할쯤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SaaS의 약자를 바꿔본 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서 편리하게 제공되듯이 과학도 과학 자체보다는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적 역할로서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다. SMR은 과학 분야 취재를 담당하기 전 건설 분야를 담당하면서 처음 접했다. SMR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사업의 성과를 언급할 때 등장하곤 했다. 건설 분야를 취재할 당시에는 주택 건설시장 취재에 무게가 실려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용어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특히 에너지난이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SMR 건설에 적극적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SMR 건설에 참여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새롭게 SMR 사업을 준비하는 건설사도 있다.
마침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내에는 SMR 관련법 자체가 없다 보니 인허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SMR에서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가 대표적이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우리나라보다 과학 발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과학적으로 앞서 있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앞다퉈 SMR 건설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자체 모델의 발전보다는 AI를 통한 기초과학과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를 통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듯이, 과학도 과학을 통해 삶을 어떻게 서비스할지가 초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jiany@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李대통령, 의정부 아파트 추락사에 "산재 즉시 직보·대책 보고" 지시
- 2“돈 때문에…한국에선 결혼 포기했다” 韓남자들, 日로 몰려간다는데
- 3“노후 돈 걱정 없다” 웬걸 80살...‘자식만 좋은 일’ [부동산 아토즈]
- 4또 아파트 화재 참변....일가족 3명 사망·20여명 긴급 대피
- 5이태원 마트 직원이 166명 살해 테러단체 조직원
- 6"연봉이 아니라 월급이라니"…하이닉스, 지난 1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
- 7후보들은 뒷전, '전한길 블랙홀'에 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 8'육각형'에 한발 더…신형 'XC60' 가성비·가심비 모두 챙겼네 [FN 모빌리티]
- 9보험금 노리고 아내와 3명의 아들 독살한 '가장' [거짓을 청구하다]
- 10돈 한푼 안보탠 여친, “신혼집 공동명의 안해줘 좀스럽다” 불만에… [헤어질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