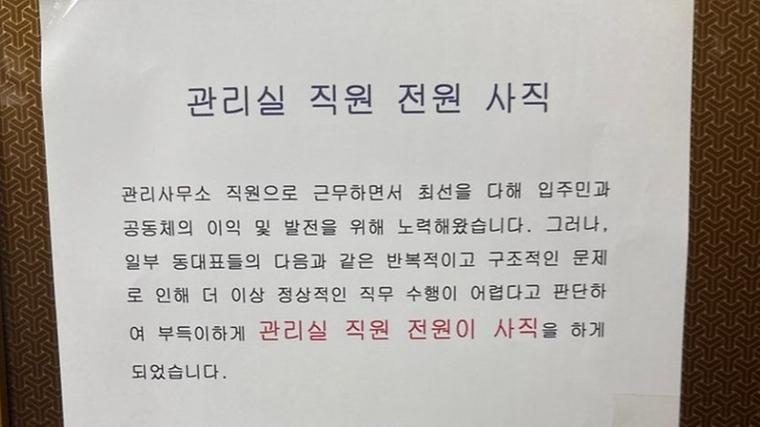'천둥의 날'이 막을 올렸다
더 세질 조롱과 본노, 혼란
그래도 도전 두려워 말길
![[최진숙 칼럼] 다이너마이트 트럼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22/202501221820227824_s.jpg)
마러라고 만찬장은 시끌벅적했다. 트뤼도 일행이 먼저 들어섰고, 트럼프는 10분 뒤 등장한다. 트럼프는 흥얼거리며 DJ를 자처했다.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 연주를 두번이나 틀었다. 오타와시에서 드론과 헬리콥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며, 캐나다 불법 이주와 밀수는 멕시코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트뤼도의 말이 음악과 술잔 부딪치는 소리를 뚫고 나왔다. 트럼프는 별 반응이 없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은 만찬이 끝나갈 즈음 나왔다. 트뤼도가 그때 어떤 대꾸를 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트뤼도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었다.
트럼프의 진심이 확인된 건 열흘 뒤다. 트럼프로부터 "위대한 캐나다주의 51번째 주지사"로 불리고 나서야 트뤼도는 자신이 그날의 제물이었다는 걸 알아챘다. 그의 몰락은 우리가 보았듯 순식간이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9년 전 집권한 트뤼도는 팬데믹 이후 물가와 민생에 실패하면서 위태로운 처지이긴 했다. 하지만 이웃 나라 정상의 일격에 마침내 무너졌다는 사실은 캐나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치욕이다.
트뤼도는 트럼프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즐겼고, 다양성을 널리 인정해 인류애를 고양했다.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죄'는 과거에 했던 트럼프에 대한 '뒷담화' 전력이다. 뒤끝 많은 트럼프가 그를 조용히 불러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는 그렇게 잔인한 쇼맨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썼다.
트럼프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측근 중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만 한 이도 없다. 그에 따르면 장인은 적들이 자멸하거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만드는 데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그는 공화당 보수논객(페기 누넌)이 "트럼프는 미쳤지만 이게 먹힌다"고 쓴 칼럼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체셔 고양이 연구도 필요하다. 체셔 고양이는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고, 극중 인물들을 미치게 만드는 캐릭터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어느 길을 택하든 목적지에 간다"는 체셔 고양이와 트럼프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1기 말 펴낸 '분노(RAGE)'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우드워드는 '분노'에서 쿠슈너 이상으로 트럼프를 간파한 인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공개된 적 없는 25통을 비롯해 총 27통의 편지를 읽어 녹음한 뒤 천천히 따져봤다. 16번이나 나온 '각하' 극존칭과 끝도 없이 과장된 아첨이 분명히 트럼프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지금 모두가 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탄핵과 암살, 갖은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어 생환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위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의 예고처럼 '천둥의 날'이 막을 올렸다. 2기 트럼프 시대 조롱과 분노, 충격과 공포가 더 독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아첨과 조공의 굴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우드워드에게 "일하는 동안 문밖에 항상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한 적 있다. 우드워드는 다이너마이트는 정작 트럼프가 맞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동의 안 할 이도 없다. 천둥 같은 소리에 놀라지 말 것. 공포에 휘둘리면 협상에서 밀린다.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 윈윈 모델을 창조할 것. 길 잃은 정치의 복원은 말할 것도 없다.
jins@fnnews.com 최진숙 논설위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서장훈, 이상민 축의금 300만원 쾌척 "부자는 달라"
- 2이미숙 "'뽕' 찍으며 많이 싸워…배드신은 대역으로"
- 3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시험관 시술…전남편은 동의 안 해"
- 4코미디언 윤정수 결혼한다…12살 어린 필라테스 강사
- 5'김건희 박사' 취소도 쉽지 않네…국민대, '연락 두절'로 절차 진행 차질
- 6'연수입 40억' 전현무, 상위 0.05% 블랙카드 사용자였다
- 7“아들 낳아야…” 아내 몰래 정관수술 풀고 임신시킨 남편 [헤어질 결심]
- 8"가슴에 '똥'이 생겼다?"..20대女, 피어싱 후 생긴 흉터 '경악' [헬스톡]
- 9서동주, 신혼여행지서 뽐낸 비키니 자태…볼륨감 몸매 [N샷]
- 10기아 준중형 전기 SUV 'EV5' 내·외장 공개…'강인함+미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