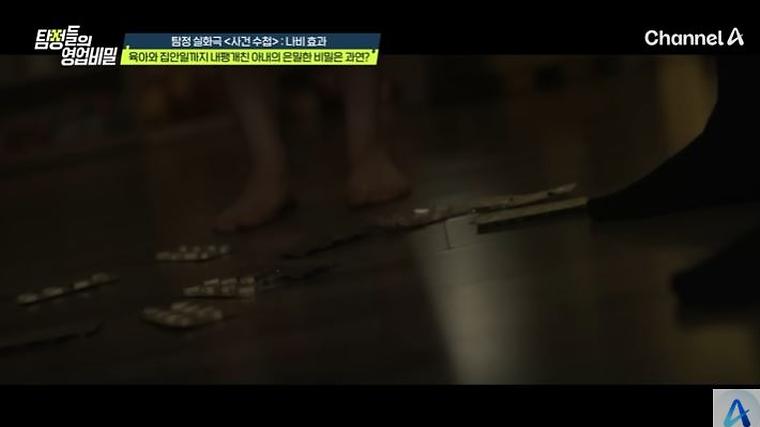줄어드는 성장세, 고착화 우려
재정 의존 한계... 구조 개혁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4~5%대를 유지하는 성장세가 1~2%대로 주저앉으며, 장기적인 침체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1.9%)과 내후년(1.8%)로 2년 연속으로 2% 성장률을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대 성장률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 됐다는 경고음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일시적인 부진을 넘어,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2000년 이후 5년 단위로 약 1%포인트씩 하락해왔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2001~2005년 연평균 성장률은 5.02%에 달했지만,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둔화가 이어졌다.
2010년 7% 급성장을 이룬 뒤 2011~2015년 3.12%, 2016~2020년 2.28%로 점차 낮아졌다.
올해와 내년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각각 2.2%, 1.9%)를 기준으로 보면, 2021~2025년 성장률도 2%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잠재 성장률로 추정되는 2%대를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금리와 같은 강력한 부양책 없다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의 성장세를 지켜내기도 힘들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대로 내년 1.9%, 2026년 1.8%의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1%대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 전망에는 내년 미국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맞물려 경제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충격에 노출되는 데다 건설침체가 겹치며 내수 부진의 골도 깊어진다는 점에서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경제활력 회복은 물론 재정 건전성,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막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총체적 난제의 해법은 구조개혁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접근법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 정책의 범주를 넘어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사회 이슈를 잇달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문제 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796명 영아 시신, 수녀원 폐하수조서 발견…아일랜드 유해 발굴 착수
- 2신지, '문원 딸 재산 상속' 우려 댓글에 "그런 일 없을 것"
- 3'강선우 곧 장관님' 정청래 응원에…"같은편 무조건 싸고 도냐?" 냉랭
- 4보아, 데뷔 25주년 콘서트 취소 "급성 골괴사 진단"
- 5野 "소비쿠폰 소득세 부과? 줬다 뺏는 조삼모사"
- 6장근석, 갑상선암 투병 고백 "가족에게도 말못했다"
- 7아내 불륜 상대가 배달 기사? "집으로 같이 들어가"
- 8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인질로 잡혔다"…요직 맡은 변호사 '저격'
- 9“혼자서도 잘 산다”던 그 유튜버, 억대 판권계약 ‘대박’으로 증명했다
- 10전한길, 재산 75억 尹 '영치금 모금'…"후안무치"




!['정현규 결별설' 성해은, 발리서 과감 호피 비키니…완벽 몸매 [N샷]](https://image.fnnews.com/resource/crop_image/2025/07/13/thumb/202507130839183816_1752370912069.jpg)
![제시, 한뼘 비키니로 파격 노출…수영장서 완벽 몸매 [N샷]](https://image.fnnews.com/resource/crop_image/2025/07/13/thumb/202507130941435244_17523709243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