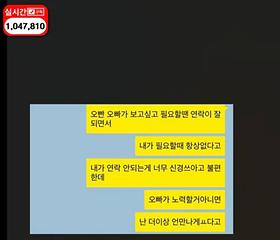![[기자수첩] 아버지의 영어, 그리고 AI](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3/202504031805585645_s.jpg)
언어의 장벽이란 높은 것이다. 사업을 했던 아버지는 늘 와세다일본어라고 적힌 테이프나 에센스 영어사전을 책상 위에 뒀다. 외국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 같다. 공부는 생계가 바쁜 사람에게 늘 쉽지 않다. 내 키가 자랄수록,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테이프 박스 위에 먼지가 쌓였다. 나는 그 먼지를 볼수록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가 30대 중반이 됐을 때 처음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용어가 적힌 영문 파일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딥엘이란 인공지능(AI) 번역기를 쓰자 순식간에 영어가 꽤 정확한 한국어로 바뀌었다. 머리 싸맬 일 없이 간편하고 빨랐다.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 문장도 바로 초벌 번역됐다. 앞으로 언어능력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AI를 다루는 능력이 새로운 장벽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AI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자신 있게 더 도왔을 텐데. 지금 영어 실력이면 아버지에게 힘이 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AI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였다면 AI산업은 한국을 더 유리한 무역협상에 임하도록 도왔을 것이다. 전 세계가 AI산업 패권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성장 4.0'에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AI를 꼽았다.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판을 바꾸기 위해선 기술의 힘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입장에선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씁쓸한 기억이 됐다. 일방적인 미국의 정책에 정부는 대응전략을 바로 발표할 수도 없다. 신중한 모습이다. 이 당혹스러운 감정이 앞으로 AI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순 없을까.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아버지 서류가 눈에 아른거렸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기억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다. 무력감이 가끔은 우리를 추동하는 감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조기대선은 안된다" 비바람에도 목소리 높이는 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 2이준석, 국힘 당대표 복귀 실패하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안줘..대법원 판단은?
- 3아내 불륜 현장 덮쳐 동영상 촬영해 처가에 유포한 50대 남편, '집유'
- 4"귀한 사랑에 보답하고파"..탈북민 공무원, 첫 월급 전액 산불 피해 주민에 기부
- 5[속보]尹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
- 6한국, 이제 인니에게도 밀리나 … 올림픽 예선 황선홍호 이어 U-17도 충격패
- 7"윤석열이 대통력직에서 파면".. 북한, 하루 지나 '간략 보도'[윤 대통령 파면]
- 8'파면' 윤석열, 지지자 향해 메시지 "대통령직서 내려왔지만 늘 곁 지킬 것"
- 9베트남, 美에 관세 ZERO 파격 제안
- 10"우크라 여성 성폭행 해도 돼"..러시아 군인 남편 부추긴 러시아女,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