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아 박사가 참여한 영국 연구진
혈액이 뇌 신경세포 활동에 영향
혈액 성분은 정상인과 차이 없지만
뇌세포 분열 줄고 자가사멸 많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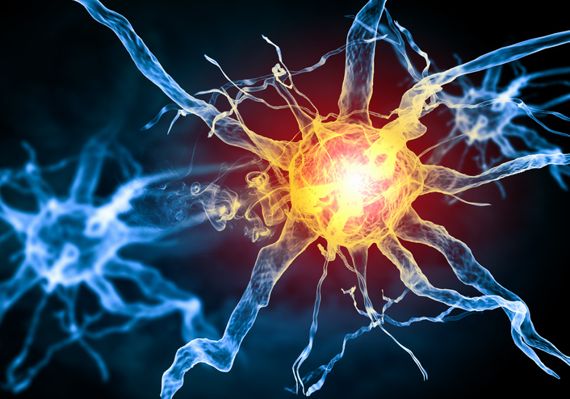
한국인 이현아 박사가 참여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신의학,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소(IoPPN) 산드린 투렛 교수팀이 인간 세포(뉴런)에 혈장을 떨어뜨려 세포 분열과 세포 스스로 죽어 없어지는 '자가사멸' 현상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즉,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사람의 피를 세포에 떨어뜨리면 정상인보다 세포 분열은 더 적고, 자가사멸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치매를 더 늦출 수 있으며, 새로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아 박사는 29일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의 세포와 혈액을 시험관에서 배양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초기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선 연구진은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경미한 인지 장애(MCI)가 있는 56명에게서 6년에 걸쳐 각각 최대 161개의 혈청 샘플을 수집했다. 혈청을 수집하면서 정기적으로 알츠하이머 진단검사도 진행했다.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인간의 해마 신경 줄기세포(뉴런)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혈청을 떨어뜨린뒤 2일 후와 10일 관찰했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56명중 36명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치매에 걸렸는데, 이들의 혈액이 뇌세포에 미치는 특징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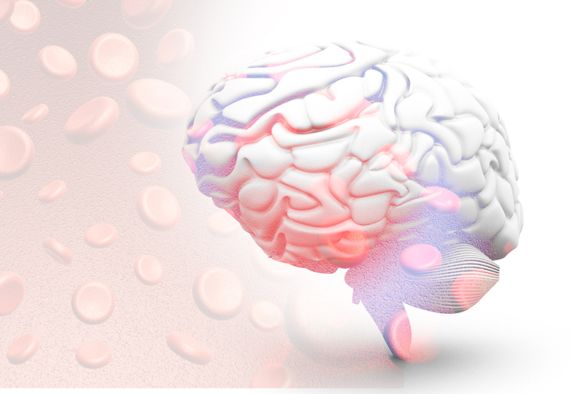
이같은 변화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예측능력(AUC) 지표가 0.93으로 나타났다. AUC가 0.5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 능력이 높다.
이현아 박사는 "이번 연구만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혈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다. 혈청 속 3620개의 단백질을 비교해 봤지만,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큰 차이가 없었다.
산드린 투렛 교수는 "알츠하이버병을 예측하는데 인간의 혈액과 뇌세포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혈액같은 인체 순환계가 뇌의 새로운 형성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와같이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