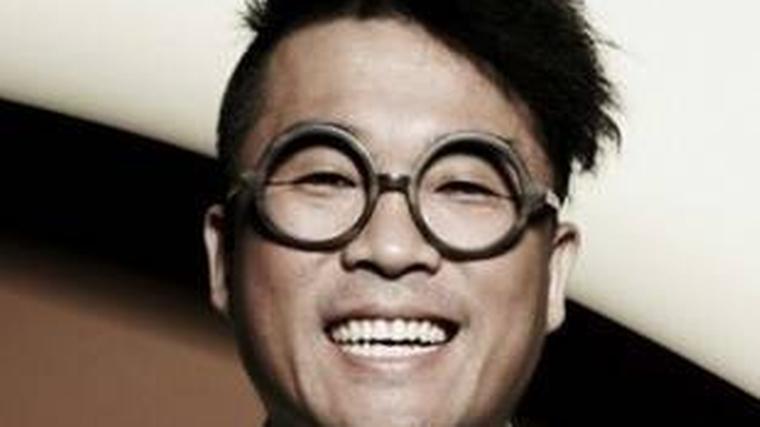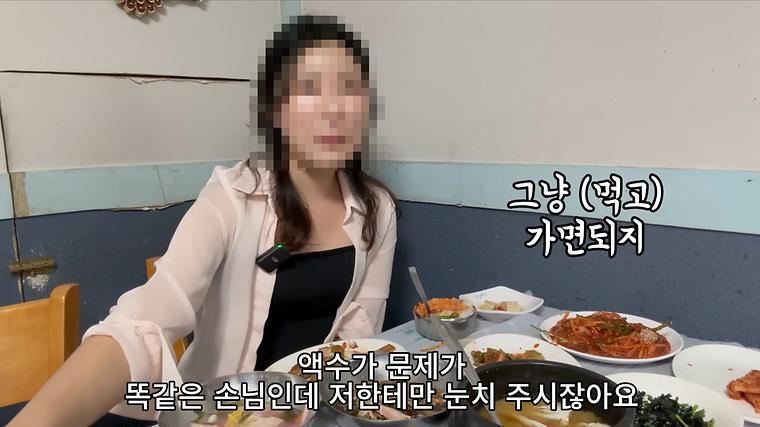![[강남시선] 소버린 AI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23/202506231852259805_s.jpg)
이재명 대통령이 '소버린 AI' 반대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일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이후 진행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다. 이 대통령이 SK 등 주요 기업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퓨리오사AI 대표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각 참석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만으로 사실상 국내 AI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를 한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이미 소비자들은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 외산 AI를 유료로 쓰고 있다. 그만큼 연결된 매개변수가 많은 데다 결과값도 뛰어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LLM을 국내 주요 기업이나 공공 전산망에 붙여 쓰는 것은 어떨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성능 여부를 떠나 민감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두겹, 세겹의 보안장치를 통해 데이터 유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해외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그 뒤에는 다른 선택지를 가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굳이 '베트남 쌀' 얘기를 꺼낸 것도 'AI 록인(AI lock-in)' 전략을 우려해서다.
공공시장 AI 발주패턴을 봐도 이런 우려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하나인 '엑사원' 얘기다. LG CNS의 경우 엑사원 모델을 쓴 덕에 다수의 금융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서 AI사업을 따냈다. 국산 AI가 해외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이즈모시와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보다 오래전에 초고령화를 겪어온 일본에 한국이 개발한 AI가 진출한 셈이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 해결책을 찾아왔기에 가능한 기술이다.
정치·문화적 이슈 또한 자국 AI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외산 LLM은 등장할 때마다 이용자들의 테스트를 받는다. 특히 각국 수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가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곧바로 뉴스거리가 된다.
독도 이슈도 대표적이다.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고성능 AI '딥시크'도 사용자들의 독도 논쟁 테스트를 피해가지 못했다. 필자는 '독도는 어느 땅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가지 언어로 던져봤다. 딥시크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어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모범답안을 출력했다. 중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상반된 입장을 내보냈다. "독도는 중국 영토이며, 중국이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을 수는 있다 치자. 하지만 영어 버전의 질문에도 중국어 버전 질문과 같은 답이 나왔다. 딥시크 측이 한국의 민감이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구글, 야후 등 해외 빅테크의 검색엔진이 앞섰을 때도 한국은 이용자 정서와 니즈를 꿰뚫는 서비스로 국내 검색 시장을 지켰다. 하지만 LLM을 기반으로 한 AI검색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ICT업계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은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혁신센터장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정한 데 이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정했다. 두 사람 모두 민간업계 출신이며, 소버린 AI를 외쳐온 전문가라는 게 공통점이다.
이 대통령의 AI 인사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전면전 선언으로 읽힌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트 생태계에서 두세 걸음 앞서 있다. 한국형 모델이 글로벌 모델과 경쟁하려면 공공과 민간, 부처와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정부의 유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sh@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이병헌 아내 이민정 "美 저택 강도 침입…서랍장 부서져"
- 2'6년째 활동 중단' 김건모, 뜻밖의 근황 "1700만원…"
- 3전청조·고유정 수감된 교도소…교도관 "수용자간 펜팔, 체모 체액도 전달"
- 4풍자 만난 선우용여 "얼굴 예쁜데 살 좀 빼라…특히 팔뚝살"
- 5'톱모델→식당 직원' 이기용, 일터 떠난다…"마음 싱숭생숭"
- 6"내가 변론 잘못해 尹 탄핵됐나, 우울했다" 김계리 유튜브 출연한 '육사출신 변호사'
- 7"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처리... 코스피5000 추가 대책 낼 것"
- 8남편에게 용돈 주는 유부녀 여사친… "이해할 수 없어, 제가 이상한가요"
- 9아내 몰래 '취미용 원룸' 얻은 남편.."이게 이혼 당할 일인가요?" [헤어질 결심]
- 10"3500만원 들여 입술 크게" 시술 전 여성 모습은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