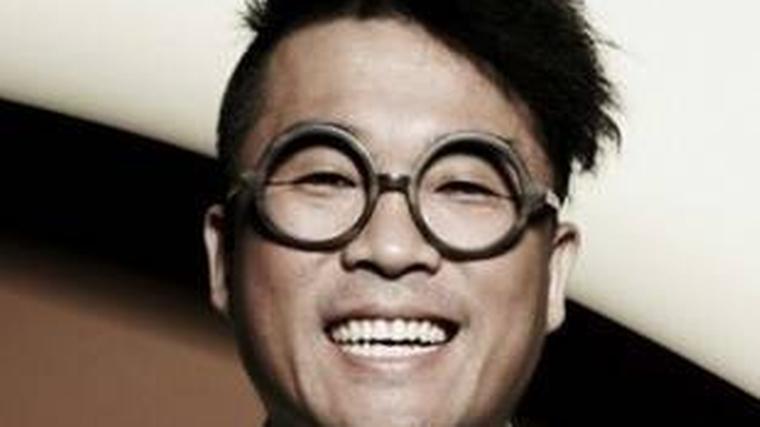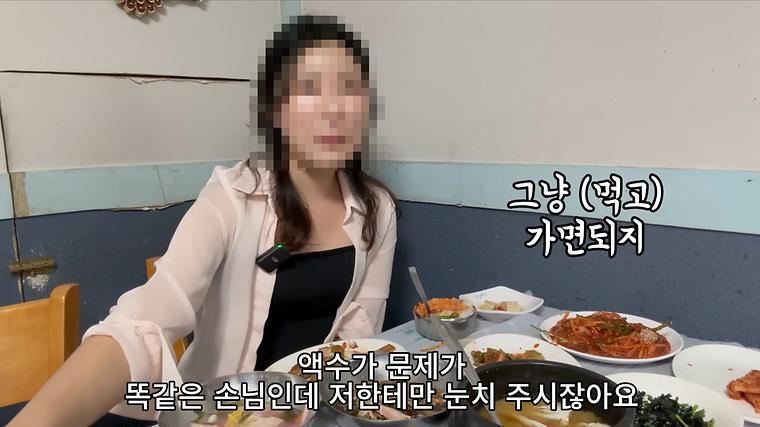내 것이 된 땅에 다른 사람의 조상묘가 있다면 철거와 이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판례를 통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도 이장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분묘기지권를 계속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경우에 따라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중요사건, 과거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내 땅의 남의 조상묘가
A씨는 지난 2008년 소송을 통해 원주시 행구동 일대 임야 1만4257㎡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 땅은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전에는 B종중 소유로 돼 있었고 B종중의 조상과 종손의 증조부 등의 묘지가 설치돼 있었다.
소유권을 확보한 A씨는 B종중 종손을 상대로 이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년 이상 B종중의 묘지가 유지돼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묘기지권은 ▲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와 ▲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남의 묘지를 무단 이장하면 형법상 ‘분묘 무단발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도 남의 땅엔 안돼”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측 참고인인 숭실대 오시영 교수(국제법무학과)는 “조선시대에도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었고 함부러 설치한 묘지 때문에 소송이 끊임없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국대전 규정과 실록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일일이 근거로 들며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001년 개정된 장사법이 묘지의 설치기간을 최장 6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이 대중화되고 자연장 등 매장이 아닌 다양한 장례풍속이 생긴 만큼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일제도 조선의 관습이라 인정”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분묘기지권이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이며 일제 강점기 판례로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시대에 분묘와 관련된 송사가 많았던 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개인이 임야 등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시효취득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927년 조선고등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다해도 20년 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습과 성문법이 충돌할 때에는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분묘기지권를 계속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경우에 따라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중요사건, 과거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내 땅의 남의 조상묘가
A씨는 지난 2008년 소송을 통해 원주시 행구동 일대 임야 1만4257㎡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 땅은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전에는 B종중 소유로 돼 있었고 B종중의 조상과 종손의 증조부 등의 묘지가 설치돼 있었다.
소유권을 확보한 A씨는 B종중 종손을 상대로 이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년 이상 B종중의 묘지가 유지돼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묘기지권은 ▲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와 ▲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남의 묘지를 무단 이장하면 형법상 ‘분묘 무단발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도 남의 땅엔 안돼”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측 참고인인 숭실대 오시영 교수(국제법무학과)는 “조선시대에도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었고 함부러 설치한 묘지 때문에 소송이 끊임없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국대전 규정과 실록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일일이 근거로 들며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001년 개정된 장사법이 묘지의 설치기간을 최장 6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이 대중화되고 자연장 등 매장이 아닌 다양한 장례풍속이 생긴 만큼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일제도 조선의 관습이라 인정”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분묘기지권이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이며 일제 강점기 판례로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시대에 분묘와 관련된 송사가 많았던 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개인이 임야 등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시효취득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927년 조선고등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다해도 20년 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습과 성문법이 충돌할 때에는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6년째 활동 중단' 김건모, 뜻밖의 근황 "1700만원…"
- 2전청조·고유정 수감된 교도소…교도관 "수용자간 펜팔, 체모 체액도 전달"
- 3이병헌 아내 이민정 "美 저택 강도 침입…서랍장 부서져"
- 4풍자 만난 선우용여 "얼굴 예쁜데 살 좀 빼라…특히 팔뚝살"
- 5'톱모델→식당 직원' 이기용, 일터 떠난다…"마음 싱숭생숭"
- 6심형탁 "가족에 상처 죽을만큼 힘들어…결혼식에 아무도 안 와"
- 7"내가 변론 잘못해 尹 탄핵됐나, 우울했다" 김계리 유튜브 출연한 '육사출신 변호사'
- 8남편에게 용돈 주는 유부녀 여사친… "이해할 수 없어, 제가 이상한가요"
- 9"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처리... 코스피5000 추가 대책 낼 것"
- 10치어리더 김현영, 터질듯한 볼륨감 과시…"사랑에 빠졌다"